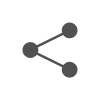갈수록 뚱뚱해지는 뉴질랜드 ‘빨간불’
20년안에 인구 절반 ‘비만’사회적 비용 연 10억 달러설탕세 도입 등 대책 시급
 |
뉴질랜드 비만 인구 비율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는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초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년 안에 국내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비만’환자가 될 것이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보고서까지 등장했다.
지난 4일 발간한 학술지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에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총 7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는 변화하지 않은 채 추세가 이어지면 현재 32%인 뉴질랜드의 성인 비만 인구 비율이 20년 뒤인 오는 2038년에는 45%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성인 인구 두명 중 한명은 ‘과체중’을 넘어 ‘비만’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연구 주관자인 윌슨 박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비만 문제로 국가적인 ‘경고등’이 이미 켜진 상태이며 비만으로 인한 보건 분야 피해는 이미 담배로 인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보건과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에 지워지는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오클랜드 대학 보이드 스윈번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06년에는 비만이나 과체중과 관련된 사회적 보건 비용이 연간 전체 보건 예산의 4.4% 수준 인 6억2천400만 달러였다. 그러나 스윈번 교수는 ‘생산성 감소’를 포함할 경우 그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심장 질환을 비롯해 뇌졸중, 당뇨병, 척추 통증을 포함한 각종 질환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보건 비용 역시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윌슨 박사와 함께 연구에 공동 참여한 오타고 대학 핵스비 애벗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유행병처럼 퍼지는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중보건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애벗 교수는 정크 푸드처럼 건강에 이롭지 못한 먹거리의 시장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좋은 먹거리들은 세금 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만 문제가 과도하고 불균형한 영양 섭취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온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하루 평균 4km에 가까운 4천582걸음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미국인보다 192걸음이 적으며 세계 최고였던 홍콩의 6천880걸음에 비해서는 확연히 뒤처진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국의 ‘설탕음료세’와 같은 정책은 일터에서 정크 푸드를 없앨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책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관련 제품 생산자들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내용물에서 당 성분을 줄인 제품들을 생산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윌슨 박사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점차 증가하는 비만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될 일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