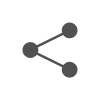책과 지성 – 뉴질랜드 관통기
뉴질랜드 ‘A부터 Z까지’ 짜릿함을 맛보다
21년차 직장인의 자동차 일주 여행기
차에서 자는 ‘차박’에 협곡열차 탑승도
“길도 내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아”
 ▲ 뉴질랜드 관통기
이해승 지음 / 책과 나무 |
‘사람들은, 나는 왜 이 멀고 구석진 끝에 와 보고 싶어 하는가. 와 보면 언제나 외로움 외에 이렇다 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어 가려고 파도처럼 쉼 없이 끝을 향해 부딪쳐 가는가.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다.-뉴질랜드 관통기 본문 396쪽’
일 년에 한 나라를 일주하고, 여행기를 한 권씩 쓰겠다고 다짐한 저자는 중남미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 일주’를 선택했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차를 빌려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을 8자 대형으로 일주하고, 33일 뒤 오클랜드 공항에 반납하는 일정의 자동차 여행이다.
책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과 함께 때로는 문학적이고 감상적으로, 때로는 사실적이고 담백한 표현들로 풀어내고 있다.
새벽 추위에 덜덜 떨다 호스텔을 18박 할 수 있는 비싼 가격에 침낭을 덜컥 사 버리고, 길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47번 국도를 여덟 번이나 오간 좌충우돌 사연들은 흥미를 더한다.
찬바람 부는 10월, 저자는 뉴질랜드 제2 도시 오클랜드에 내렸다. 배낭을 멨고, 혼자였다.
묵묵히 자동차를 빌려 붉은 포후투카와(Pohutukawa) 꽃이 핀 북섬 땅 끝 케이프 레잉가로 갔다.
죽은 마오리 영혼이 나무뿌리를 타고 고향 하와이키로 돌아간다는 그 절벽, 저자는 거기서 하얀 등대와 노란 이정표와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연민을 보았다.
라우푼가(Raupunga) 마을을 지나는데 날씨가 맑다. 힘껏 찡그려야 간신히 하늘을 올려다볼 정도다. 만발한 라일락과 아카시아를 다발로 엮어 코앞에서 살랑살랑 흔드는 향이 난다. 달고, 부드럽고, 새콤달콤하다. 바람에서 이런 향이 나다니. 내려서 사진 한 장을 찍는다. 11시 47분, 카메라에 바람 향이 구도 좋게 찍혔다. 각자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지금은 더욱 절절해진다.
그리고 완고한 표정으로 사막과 바다, 초원, 구릉을 스치며 남쪽으로 달렸다. 북섬 맨 아래 웰링턴에 도착하자 페리를 타고 쿡 해협을 건넜다. 들불 같은 말버러 사운드 픽턴에서 저 먼- 남섬 끝 블러프까지 또 달렸다.
그 사이 서던 알프스(Southern Alps)의 험준한 아서스, 하스트, 루이스 패스를 넘었다. 유빙이 둥둥 뜬 호숫가에 보랏빛 루핀과 누런 터석(Tussock)에 현혹됐고, 달빛 젖은 마운트 쿡과 에오스의 황금마차가 몰고 온 샤프란 색 아침들에 경탄했다.
달빛은 금세 물러나고 에오스(Eos)의 황금마차가 큰 바람을 일으키며 사프란(Saffron)색 아침을 몰고 왔다. 풍찬노숙한 산토끼들이 하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이슬 머금은 풀을 뜯는 사이 동쪽 하늘에 온통 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에오스의 손가락이 시뻘건 불덩이 하나를 마운트 쿡 정상 오른뺨에 옮겨 붙인다. 불길은 마운트 허턴(Mount Hutton), 세프톤(Mount Sefton), 실 리(Mount Sealy)에 옮겨 붙고, 마운트 쿡 빌리지 전체를 환하게 밝힌다. 아침이다.
저자는 “오래된 도시 더니든과 크라이스트처치와 기즈번의 야자수 아래 한동안 쉬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오클랜드로 되돌아오는데 33일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고행도 자학도 유희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일상에 함몰돼 특별한 각인 없이 죽음으로 수렴해가는 예측 가능한 삶에 대한 소심한 저항이었고, 모든 것에 치인 뒤 남는 몫이어도 나대로 존재하겠다는 대한민국 중년 남자의 미지근한 열렬함이었다. 이 책은 그 여정을 담아 느리게 찰랑대는 주머니”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또 “이름 모를 길 위에 숲 그림자 드리우고, 설산이 기다리고, 모퉁이 돌자 둥그런 해안선이 탁 트인 바다를 선물하고, 짠내와 라일락 향과 온갖 것의 향이 섞여 코를 간질인다. 뜨거우면 모자를 쓰고, 더우면 앞섶을 조금 열고, 추우면 고개를 움츠린 채, 나는 계속 앞으로 달려간다”며 “길은 끝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