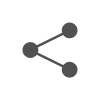뉴질랜드 인권위, ‘시설은 학대의 공간’…국가의 진상규명과 사과 요구
뉴질랜드 06년 거대 시설 폐쇄 완료…인권위,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뉴질랜드인권위가 발간한 보고서 ‘Institutions are places of abuse’ 표지. 보고서 표지 갈무리
|
뉴질랜드인권위원회가 국가가 운영했던 병원 및 시설(아래 국가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시행하고,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설은 학대의 공간이다(Institutions are places of abuse)’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인권위가 올해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에 코레 아노: 네버 어게인(E Kore Ano: Never Again, ‘결코 다시는’이라는 뜻의 마오리어와 영어)’을 통해 모인 증언과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에 코레 아노’ 운동은 1950~1990년대에 국가 시설에서 살았던 아동과 성인에 대한 학대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국가 시설에서 거주했던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공개적이고 의미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6년 ‘킴벌리 센터’를 마지막으로 대형 국가 시설이 모두 폐쇄되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인권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탈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빼앗긴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뉴질랜드인권위 장애인권위원인 폴 깁슨은 “우리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앞으로는 조직적인 학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싶지만, 엄격한 조사 없이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없다”라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깁슨은 “뉴질랜드에는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장애인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학대 문화(abusive culture)’가 있었다”라며 “‘서비스냐 사랑이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이러한 문화를 만든 것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인권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전에 몇몇 사례에서는 학대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절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권익 옹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에코레 아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것은 ‘감금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별도의 공간에 처벌 목적으로 감금되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외출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 생활 자체 역시 포함된다.
“우리는 밤에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 빌라에 갇혀서…우리는 어디도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전혀, 전혀 단 한 번도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매우 힘들었어요.” (존 테 키리, 시각장애인, 12세 때부터 시설 거주)
“저한테는 자유가 없었어요. 내내 갇혀 있었고, 그게 제일 싫었어요…밤에는 항상 직원들이 문을 잠궜어요. 저는 침실에 갇혀 있었어요.” (위치몬드, 지적장애인, 킹싯 병원 거주 당시 경험)
성적 학대 역시 거의 모든 증언에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같이 생활하던 거주인으로부터 당한 경우도 있고, 직원으로부터 당한 경우도 있었다.
“(밤에 직원이 없으니까) 어떤 남성 거주인이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했어요. 제가 열 한 살 때요. 그 사람을 신고했고, 직원들이 다음날 모든 남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집어냈어요.” (앨리슨, 지적장애인, ‘시설에서의 50년’ 저자)
“사과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남자 간호사가 저를 사무실로 끌고 갔고 그 사람은 제 파일을 꺼내서 제가 잘못한 것을 모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 바지에 손을 넣어서 저를 만졌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고 다만 제가 나쁜 짓을 했고 이 사람은 저를 돌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로버트 마틴, 지적장애인, 생후 18개월부터 킴벌리 센터 거주)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그리고 과도한 통제와 억압 역시 주요 피해 사례로 지적되었다.
“직원들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면서 씻고 면도하고 아침을 먹으라고 말했어요…직원들이 말하기 전에는 식당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데이빗 블래켓, 지적-시각 중복장애, 세 살부터 시설 거주)
“시클리프 시설에 살 때, 거기 직원들은 제가 화장실에 가게 하려고 저에게 파라핀을 먹였어요(파라핀을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편집자 주). 진짜 끔찍했어요.” (애비스 헌터, 지적장애인, 생후 3개월부터 시설 거주)
“어렸을 때 누군가 만지거나 안아줬던 기억이 없어요. 어린애였을 때 한 번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도요…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해요.” (로버트 마틴)
▲ ‘네버 어게인’ 캠페인 동영상 중. 시설 내 인권침해 피해자가 “(정부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뉴질랜드인권위는 이들이 겪었던 학대를 시설 학대(institutional abuse)이자 조직적 학대(systemic abuse)라고 보았다. 시설 학대는 직원과 거주인 간의 압도적 권력 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학대 사실이 시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학대가 발생하는 근원적 요인이 시스템 구조나 정책 등에 있는 경우, 이를 조직적 학대라고 본다.
뉴질랜드인권위는 “조직적 학대는 ‘나쁜 사람이 한 나쁜 짓’이 아니라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이 제공되는 경우나 그러한 상황이 제재 없이 계속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에서 발생했던 학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 조직적 학대가 발생했던 환경을 촘촘히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인권위는 이러한 추가 조사를 위한 제안 역시 보고서에 담았다. 우선적으로는 “시설에 간 장애아동들은 가정에서도 학대받았던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장애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국가가 어떤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할지 질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을 대체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역시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인권위는 “학대를 발생시키는 독립요인은 언제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잘 드러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조직적 학대 발생 가능성에 늘 예민하게 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인권위는 1977년 설립된 국가 기구로, 법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 코레 아노’ 캠페인 이외에도 여성, 성소수자, 마오리 등 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