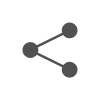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어떻게 붙잡혔나
 |
그중에서도 오클랜드에서 자동차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민 모(50) 사장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민 사장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가 과거 오클랜드에 살 때 자신의 업체에서 자동차를 샀던 인연으로 잘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5일 연합뉴스에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한국에서 김씨가 전화해 곧 오클랜드로 가는 데 자동차를 사겠다고 말한 데 이어 24일 오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아내 정 모(32) 씨, 어린 두 딸과 함께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 있는 호텔에 와 있으니 자신을 매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민 사장은 직원을 보내 김 씨를 데려오게 했다.
김 씨는 오랜만에 만난 민 사장과 포옹까지 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국 담배라며 담배도 권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덥석 3만5천 달러(약 2천700만 원)짜리 2010년식 벤츠 SUV를 샀다. 대금은 5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배낭에서 꺼내서 지불했다.
민 사장은 배낭에는 눈짐작으로 10만 달러 가까이 돼 보이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어 깜짝 놀랐다며 그래서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고 묻자 강원도에서 펜션을 지어 몇억 벌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2015년까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목수 조수를 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민 사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 공항에서 외환 반출에 어려움은 없었느냐는 질문도 던져 보았다.
그러자 그는 “영주권자라고 밝히고 다 신고했다”며 출입국 과정에 모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 사장은 뭔가 찜찜했지만 더는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틀 뒤 뉴스를 보고 민 사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김 씨의 어머니가 용인에 산다는 얘기도 전에 들어서 아는 데다 성이나 연령대로 볼 때 뉴질랜드로 도주한 일가족 살해 용의자가 김 씨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26일 밤 그 뉴스를 접한 그는 이튿날 곧바로 한국대사관 오클랜드 분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차종과 차량 번호, 오클랜드 북쪽 실버데일에 집을 얻겠다고 한 말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동생 같은 사람을 신고하려니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갈등이 심했다. 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사회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또 새로 산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김 씨의 임대주택으로 배달해준 한인 운송업체 서 모 사장도 영사관으로 신고했고 김 씨의 전화를 받았던 한 한의원도 김 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공개하며 교민사회와 정보를 공유했다.
서 사장이 오클랜드 분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한 때 약간의 혼선도 있었으나 교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으로 김 씨는 스스로 숨어든 교민사회에 꼼짝없이 갇히는 꼴이 됐다.
제보자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강력범의 보복이 신경쓰이면서도 교민사회의 안전을 더 걱정한 결과였다.
교민들의 이런 시민의식 덕분에 오클랜드 분관은 현지 경찰과 연락하며 김 씨에 대한 수사망을 촘촘하게 좁혀갔다.
드디어 현지 경찰은 28일 수사팀을 정식으로 구성한 데 이어 29일에는 한국에서 공식적인 인도 구속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임대주택에 살 때 세탁기, 냉장고 등 4천1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오클랜드 시내 한 건물에서 김 씨를 전격 체포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구속 수감했다.
한국 측의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인도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조치다.
어머니(55)와 이부(異父) 동생(14), 계부(57)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도주 드라마는 도피처로 삼은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의외로 쉽게 막을 내린 셈이다.
오클랜드 분관의 이용규 경찰 영사는 김 씨 검거에 공이 많은 민 사장 등에 대해서는 본국에 감사장과 포상금을 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