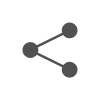뉴질랜드·네덜란드 총기난사로 보는 혐오의 악순환
 |
최근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총기 난사가 잇달아 발생해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하지만 두 사건을 대하는 백인 사회의 반응에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두 사건 모두 명백한 테러임에도 ‘테러=무슬림’이라는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는 것.
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모스크)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무려 50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브렌턴 태런트(2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행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범행 전에는 SNS에 반(反)무슬림, 반(反)유색인종적 주장이 담긴 선언문을 올려 범행 이유도 밝혔다. 자신들 땅이 침략자들(이민자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격하기로 했다는 것.
이는 명백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의 혐오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백인 사회에서는 끔찍함을 성토했을뿐 무슬림에 대한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심지어 프레이져 애닝 뉴질랜드 상원의원은 “누가 무슬림 이민과 테러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라며 총기 난사의 원인을 무슬림 이민으로 돌렸다.
이틀 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 괴크만 타니스(37)는 사건 발생 7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네덜란드 총기 난사를 다룬 현지 언론들은 타니스가 ‘터키 출생의 이민자’라는 점을 부각해 보도했다.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데자뷔처럼 ‘테러=무슬림’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행태다.
두 사건은 모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명백한 테러 사건이다. 하지만 무슬림은 곧 범죄자, 테러리스트라는 고정 관념이 백인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비단 백인 사회뿐만이 아니다. 알게 모르게 비(非)이슬람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