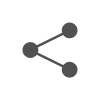뉴질랜드 남자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탈출한다? “미친 소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가짜뉴스 거르기
창문 너머 노랗고 빨간 단풍잎이 흐드러진 덕수궁 돌담길이 보였다. 옛 러시아 공사관 앞 건물 8층에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서양식 건물과 덕수궁이 낙엽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대사관 앞에는 마오리족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벽을 따라 뉴질랜드의 총천연색 자연을 담은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선 유럽계 백인과 마오리족, 동양인들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베이지색 양복에 주황 넥타이를 맨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들어왔다. 대사는 ‘헬로(Hello)’와 ‘안녕하세요’를 번갈아 외치며 악수를 청했다. 호탕하게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와 자리에 앉은 그가 처음 건넨 말은 “이 풍경을 보라.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풍경은 보지 못한다”였다. 그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대사다. 그는 지난 4월 주한 뉴질랜드 대사로 부임해 한국에서 8개월 남짓 생활했다. 1986년 외교계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는 2000년 뉴질랜드 최대 낙농기업인 ‘폰테라’로 이직해 유럽과 일본, 중국을 오가며 해외지사 업무를 맡았다. 이젠 기업이 아닌 정부를 대표해 뉴질랜드와 한국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성소수자다. 터너 대사는 “내 파트너는 남성이고 24년간 함께했다”며 “올해 결혼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던 그였지만 한순간엔 정색했다. 기자가 한국에 퍼진 뉴질랜드의 페미니즘 이야기를 전한 때였다. 그는 “모두 터무니없는 루머이고 미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경험한 뉴질랜드는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그가 본 한국은 어떤 곳일까. 성소수자 대사를 통해 페미니스트의 나라, 뉴질랜드를 들여다봤다.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