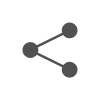설탕 같은 눈 ‘반지의 제왕’ 속 그 풍경
심장이 뛰는 도시 뉴질랜드 퀸스타운
 ▲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개 ‘찰리’와 주인이 일출을 배경으로 와카티푸 호숫가를 걷고 있다. Z 모양인 와카티푸 호수는 총 길이가 80㎞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는 이 호수 밑에 ‘마타우’라는 거인 괴물이 잠들어 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호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25분 간격으로 수면이 10㎝쯤 오르내린다. 마타우의 심장 박동일까?
|
“직진하고 싶으면 핸들을 앞으로 미세요. 멈추고 싶으면 핸들을 당기고요. 잘하시네요. 출발!”

최대 심박수: 4D 영화 속으로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Queenstown)은 매년 주민의 100배가 넘는 300만명이 여행을 오는 작은 도시다. 케이크 위에 하얗게 뿌려진 설탕 가루처럼 눈이 쌓인 리마커블산과 알파벳 ‘Z’ 모양으로 생긴 와카티푸 호수는 아름답다. 수많은 판타지 영화의 배경이 된 도시답게 어느 곳을 찍어도 명장면이다. 하지만 엽서 같은 풍경도 하루만 지나면 익숙해진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액티비티다.

마운트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 부근 다트강을 최고 시속 80㎞의 제트보트를 타고 누볐다. 옆 사람의 말소리도 듣기 어려운 거센 바람에 360도 보트 회전으로 물 폭탄까지 맞았다. 홀딱 젖었지만 웃음이 터졌다. 4D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에 심장이 뛰었다. “퀸스타운에서 5개월을 매일 다른 액티비티로 즐길 수 있죠.” 뉴질랜드 관광청 관계자가 말했다. 스키, 제트보트, 카약, 루지, 곤돌라, 숲에서 즐기는 하이킹…. 수백 개의 액티비티에 지루할 틈이 없다.
최저 심박수: 끝없는 산과 호수

퀸스타운을 떠나는 아침, 일출을 보고 싶어 세수도 안 하고 호숫가로 뛰어나갔다. 선글라스를 쓴 개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반갑게 몸을 비볐다. “이름이 뭐예요?” 개와 함께 산책 나온 노인은 “찰리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방인을 경계하긴커녕 꼬리를 흔드는 찰리의 온기에 심박수가 낮아졌다. 호수를 둘러싼 리마커블산 사이로 마침내 해가 떠올랐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를 배고플 때까지 바라봤다.
한국에서 퀸스타운으로 가는 직항은 없다. 인천에서 오클랜드까지 11시간, 북섬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국내선을 타고 2시간 더 가면 퀸스타운에 도착한다. 에어 뉴질랜드는 23일부터 인천~오클랜드 직항 노선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