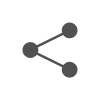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송년회에 ‘여성 참정권 125주년’을 내건 이유는
 ▲ 뉴질랜드 10달러 지폐에 그려진 케이트 셰퍼드 ©뉴질랜드 중앙은행
|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본성 때문에 정치적 삶에 적합하지 않다. 도움받아야 하는 애절한 존재다. 남자에게 종속돼야 한다.”-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eau·1712~1778)

장 자크 루소
“조금씩 떼주는 ‘영역’을 나눠 받는 것에 지쳤다. 그 영역 밖에서 ‘여자는 안된다’는 말을 듣는 것도 피곤하다. 어떤 위험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19세기 뉴질랜드 정치인, 케이트 셰퍼드(Kate Sheppard·1848~1934)

케이트 셰퍼드
연말이 되면 매해 말 많고 탈 많던 시간처럼 느껴진다. 한 달도 채 안 남은 2018년에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올해는 ‘미투’에 이어 ‘페미니즘’이 관심을 끈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투표권)을 선언한 125주년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열린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획득 125주년 기념 리셉션’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여성 참정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지난 11일 밤 서울 중구 이태원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는 그래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가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획득 125주년 기념 리셉션’ 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초대해 송년회를 가졌다.
‘마누카 꿀·골드 키위·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뉴질랜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에선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다. 사람 수로 치면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 규모인 뉴질랜드는 사실 ‘여성 인권·사회적 소수·양극화’ 등 사회 이슈 해법을 앞장서서 찾고 있는 나라다.
여성 참정권 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고령자 연금도 앞장서서 도입했다. 성 소수자(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와 토착 원주민,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법안도 이어진다.
다시 여성 참정권으로 돌아가보면 1893년 9월 19일 뉴질랜드 의회는 여성 참정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던 근대 18~19세기 스웨덴이나 코르시카공화국, 식민지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이 일시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사례는 있지만 현재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선 뉴질랜드가 처음이라고 한다. 뉴질랜드가 자치국가가 된 건 1907년이고, 완전히 독립한 건 1947년으로 비교적 최근 일이다.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고향처럼 오르내리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유럽이 아니라 한때 영국 식민지이던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은 재밌는 대목이다. 여기엔 사실 케이트 셰퍼드가 빠질 수 없다.
그녀가 누군지 모를 수 있다.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윈즐릿도 아니고 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도 아니고 케이트 셰퍼드라니, 생소한 이름이다. 하지만 케이트 셰퍼드는 뉴질랜드 10달러짜리 지폐 주인공이다.
영국 리버풀 출신인 케이트 셰퍼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로 이민 왔다. 그는 사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여성 기독교인 절주 연합’ 일을 하면서 사회에 나왔다. 절주라는 게 술을 끊자는 것이어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싶지만 절주 운동의 주된 지지층이 여성이다 보니 여성 문제로 관심이 뻗어나갔다. 셰퍼드로서도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 법하다.
당시엔 뉴질랜드가 영국에 속해 있다 보니 더욱이 참정권을 주장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셰퍼드는 연설을 잘했다고 한다. 그는 “인종과 계급, 종교, 성별을 전부 포함해 비인간적인 건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888년엔 ‘뉴질랜드 여성이 투표해야 할 이유’라는 팸플릿을 만들어가며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간절한 바람이 한번에 이뤄지는 역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케이트 셰퍼드도 여성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청원서를 1888년과 1891년, 1892년, 1893년 연달아 의회에 냈다. 1891년에는 자신이 직접 여성 투표권 인정을 내용으로 한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도 한다.
셰퍼드가 절주 운동가이면서 이른바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반대한 세력은 술 만드는 주조 업계였다. 그래도 셰퍼드는 ‘어떤 리스크 앞에서도 나는 나여야 한다’는 자신의 말마따나 기죽지 않고 활동했는데, 할머니가 된 후에도 여성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많은 성 갈등이 빚어졌다. 페미니즘이라는 말만 해도 논란이 일어날 정도이고 일부는 ‘페미니즘 따위’로 비하하기도 한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페미니즘은 사실 인권, 자유주의, 평등과 관련한 개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등급 매기기’를 좋아한다. 설령 루소처럼 여자가 열등하다고 여긴다 한들 그게 끝이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백인 우월주의 같은 인종차별주의 앞에서 어차피 비슷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전 무죄·무전 유죄’식의 ‘돈이면 전부인 세상’ 혹은 ‘쟤는 몇 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더라’ 하는 식의 우열 가리기 앞에서 불평등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남자들은~ 여자들은~’이라든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이라든지 ‘아시아인들은~ 흑인들은~’이라는 식의 차별과 편견이 잘못됐다는 것, 결국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 노력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케이트 셰퍼드나 각종 기념식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진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앞줄 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각국 대사 등 참가자들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