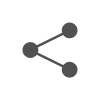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Too complicated?’ Controversy over New Zealand’s English-Maori bilingual traffic signs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sparked controversy by promoting the use of both English and the indigenous Maori language on traffic signs, according to a report by CNN on the 29th. The intention is good, but the traffic sign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instantly, have become too cluttered.
According to the report, the New Zealand government recently held a public hearing on whether to use both English and Maori on 94 road traffic signs, including place names, speed limits, and various warnings.
The opposition National Party opposed the plan, arguing that if another language was added, there would be less space for English words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drivers to read smaller letters.
A National Party spokesperson said, “Signs must be clear. We all use English and signs must be in English,” arguing that complex signs could confuse people driving at high speeds.
In response, ruling Labor Party Prime Minister Chris Hipkins criticized the opposition for engaging in thinly veiled racist politics.
“If this isn’t an obvious ‘dog whistle,’ I don’t know why they brought up this issue,” Hipkins said. A dog whistle is a political strategy that delivers a message that only a specific group can understand.
It is a tactic to subtly stimulate white voters.
The sign issue was triggered as the ruling Labor Party struggles to regain power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in October, CNN reported.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from the New Zealand government, less than a quarter of the 892,200 Maori in New Zealand use Maori as their first language.
Those who oppose bilingual signs in New Zealand cite the fact that 95% of the population uses English. The total population of New Zealand is about 5.15 million.
However, supporters of bilingual signs also cite the same data.
One reason why Maori is not widely used is because white people suppressed it during colonial times.
In fact, in 1867, the Native Schools Act required schools to teach English as much as possible and students who used Maori were punished.
As a result, Maori disappeared, but the New Zealand government is now trying to restore it.
In 2018, a five-year plan was launched to restore Maori an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can speak more than a few words or phrases in Maori increased from 24% to 30%.
Bilingual signs are also part of that effort, according to CNN.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set a goal of having 85% of New Zealanders view Maori as a core element of the nation by 2040, with one million people able to speak basic Maori and 150,000 Maori over the age of 15 using Maori as well as English.
However, expert opinions on the safety issue of bilingual signs are somewhat divided.
The New Zealand Transport Agency cited Wales’ signs as an example and said that using both English and Welsh actually improved safety.
Traffic behavior expert Professor Kasem Chucharungkul of Chulalongkorn University in Thailand said there is no evidence that bilingual signs themselves have a negative impact on drivers’ comprehension.
However, he emphasized that road sign design and placement, language and context should be carefully handled.
According to research from Leeds University in the UK, signs written in more than four lines can significantly reduce driver reaction time.
CNN reported that if the New Zealand government implements dual-language signs, it must be careful not to make translation errors.
As an example of an unfortunate incident involving dual-language road signs in Wales, CNN introduced one story.
In 2008, a local government road sign production department in Wales asked an internal translation team for Welsh expressions for road signs that read “No entry for large vehicles. Residential area” in Welsh.
The production department made a sign with the contents received by email, but it was written in Welsh: “I am not in the office now. Please send me something to translate.”

‘너무 과했나’ 뉴질랜드 영어-마오리어 이중 교통표지판 논란
뉴질랜드 정부가 교통 표지판에 영어와 원주민 마오리족의 언어 병기를 추진했다가 논란을 빚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취지는 좋지만 순간적으로 바로 알아봐야 할 교통표지판이 너무 난잡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지명, 속도제한, 각종 경고 등을 알리는 94개의 도로 교통 표지판에 영어와 마오리어를 병기할지를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자 우파 야당인 국민당은 이 계획에 반대하며 다른 언어가 추가되면 영어 단어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고, 운전자들이 작아진 글씨를 읽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당 대변인은 “표지판은 명확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표지판은 영어로 돼 있어야 한다”며 복잡한 표지판은 고속으로 달리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집권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야당이 얄팍하게 가려진 인종차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힙킨스 총리는 “이게 노골적인 ‘도그 휘슬'(dog whistle)이 아니라면 그들이 이 문제를 왜 꺼내 들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그 휘슬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 전략을 말한다.
교묘히 백인 유권자를 자극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이번 표지판 문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노동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촉발됐다고 CNN은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마오리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내 전체 마오리족 89만2천200명 중 4분의 1이 되지 않는다.
현지에서 이중 언어 표지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인구의 95%가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515만명 정도다.
그러나 이중 언어 표지판 찬성론자들도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마오리어가 널리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식민지 시대에 백인들이 마오리어를 없애려 억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867년 ‘원주민 학교법’으로 학교에서 가능한 한 영어를 가르치도록 했고 마오리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체벌받기도 했다.
그 결과 마오리어는 사라져갔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이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마오리어 복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결과 마오리어를 몇 개 단어·구절 이상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24%에서 30%로 늘었다.
이중 언어 표지판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CNN은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40년까지 뉴질랜드인의 85%가 마오리어를 국가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100만명이 기초 마오리어를 구사하며, 15세 이상 마오리족 15만명이 영어만큼 마오리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다만 이중 언어 표지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뉴질랜드 교통국은 영국 웨일스의 표지판을 예로 들며 영어와 웨일스어를 모두 써 오히려 안전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교통 행동 전문가인 태국 쭐랄롱꼰대 까셈 추찰루꿀 교수는 이중 언어 표지판이 그 자체로 운전자의 이해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로 표지판의 디자인과 배치, 언어와 맥락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4줄 이상으로 쓰인 표지판은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뉴질랜드 정부가 이중 표지판을 시행하려면 번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웨일스의 이중 도로 표지판과 얽힌 웃지 못할 사연을 CNN은 소개했다.
2008년 영국 웨일스의 지방 정부 도로 표지판 제작 부서는 웨일스어로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금지. 주거 지역’이라는 도로 표지판을 만들려고 내부 번역팀에 웨일스어 표현을 의뢰했다.
제작 부서는 메일을 통해 답장받은 내용으로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그 표지판에는 웨일스어로 ‘저는 지금 사무실에 없습니다. 번역할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