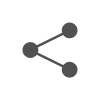뉴질랜드에 달러 숍이 너무 많은 이유
 |
뉴질랜드에서는 달러 스토어에 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달러 스토어가 많은 데는 불편한 이유가 있다고 스터프가 14일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 요지.
지난 1994년 $2숍이 처음 문을 열었다. 생일 카드, 문구, 잡화, 부엌 용품, 전화 충전기, 장난감 등 물건을 싸게 파는 수백 개의 상점들이 전국에 생겨났다.
뉴플리머스에 사는 리사 랑이도 ‘베스트4레스’, ‘골드코인’, ‘달라킹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피츠로이 학교 합창단 어린이들의 의상도 그런 곳에서 샀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다른 가게에 가면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빨간색 머리 리본이 꽤 비싸지만 베스트4레스에 가면 2달러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키위들이 바겐세일을 선호하지만 플라스틱 조화와 생일 풍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달러 스토어들이 많이 생겨났다기보다 뉴질랜드 사업체들의 인종주의적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이민문제 전문가인 사회학자 폴 스푼리 교수의 견해다.
그는 “많은 사업체들이 지금도 이민자들을 노동력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오클랜드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선호하는 직원 순위가 가장 낮은 게 이민자와 학교 중퇴자들이었다. 문제가 있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뉴질랜드 헤럴드는 인도 이민자 파이아즈 콘트락토르(42)가 주유소 급유 직원에서 금융사업개발 매니저가 됐다며 이는 이름을 프랭크로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AUT 대학 연구도 이민자들이 키위 이름으로 개명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일을 찾지 못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자신의 가게를 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푼리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음식, 저가 소매, 데어리, 프랜차이즈 등에 이민자들이 많이 몰린다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방법”며 이민자들이 숙련 기술 이민자로 들어와도 결국 자영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타라나키 이민자 커넥션 코디네이터인 기타 커티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출신의 뉴플리머스 달러킹덤 부매니저 아르피트 샤르마는 인도에서는 은행원이었지만 3년 반 전 뉴질랜드에 왔을 때 일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샤르마는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위해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와서 오클랜드 거주 중국인이 소유한 달러킹덤에 일자리를 얻었다.
한국 출신으로 $2싱스 체인을 가진 한 사업가는 14세 때인 17년 전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 와 지금은 시민권자가 됐다. 전국에 14개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에 왔을 때 부모가 주로 언어 장벽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처음 몇 년 간은 힘들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직원들이 이민자들로 영주권을 얻으려 하고 있다며 모국에서는 모두 뛰어난 숙련 일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모도 잘하지 않는다”며 “결국 스시 가게, 달러 스토어, 식당 등에서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타라나키에 사는 중국인 베티 륭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플리머스 지역 전 시장으로 스스로 인종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앤드루 저드는 뉴질랜드의 인종주의는 자신들의 문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일 우리들이 문화적으로 우리 스스로 지구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