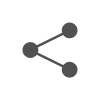시리아 난민 가정, 교회와 지역사회 도움으로 뉴질랜드에 새 보금자리 얻어
 ▲ 26세 부인 샤위시와 28세 남편 알 카탄, 그들의 9개월된 아들은 시리아를 떠나 뉴질랜드에 정착했다 ©STUFF
|
시리아 난민 샤위쉬(Hayat Shawish)와 모하메드 알 카탄(Mohammed Al Qattan) 부부는 전쟁 중인 고국 시리아를 떠나 9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티마루(Timaru)에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지난 7월 5일 요르단에서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 가정은 오클랜드 망게레 난민정착센터(Mangere Refugee Resettlement Centre)에서 진행된 2주간의 난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7월 19일 사우스 캔터베리에 정착했다.
부부는 지난 수요일 티마루의 새 집에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했다. 아직 얼굴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존의 난민 쿼타 제도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시범 제도를 통해 뉴질랜드에 올 수 있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지역사회 기관의 지원을 통해 난민을 수용하는 시범 제도가 진행 중이다.
26세 샤위시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 2012년 부모, 형제들을 두고 피난길에 올랐다.
샤위시의 가족은 시리아 다마스쿠스(Damascus)에 살고 있었다. 당시 다마스쿠스에서는 살인, 납치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고 다마스쿠스 대학(Damascus University)은 폭격을 받았다. 샤위시는 다마스쿠스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 중이었다.
남편인 28세 알 카탄은 같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강제 징용을 피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도피했다.
“군에 가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남편은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부인 샤위시는 말했다.
알 카탄은 레바논에서 5개월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요르단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식당 카운터와 회계 업무를 봤다.

사우스 캔터베리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시리아 난민 가정의 생후 9개월 아들 ©STUFF
식당에서 5년간 일한 그는 가족 간의 친분으로 지난 2016년에 샤위시를 만났고 그 해 12월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요르단에 있는 모든 시리아 난민 규정에 따라 이 부부는 난민 등록 절차를 밟았다. 2017년 10월 유엔(UN)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던 부부는 영국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부부는 다시 유엔으로부터 뉴질랜드로 갈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샤위시는 당시 뉴질랜드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이후 뉴질랜드 정부의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관계자가 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샤위시는 “요르단 정부가 남편이 회계사로 일하는 것을 막으면서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요르단에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부부는 건강 검진을 받고 6월 1일에 최종적으로 뉴질랜드행 소식을 접했다.
샤위시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친절하고 호의적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남편 알 카탄은 현재 구직 활동 중이며 부인 샤위시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키위가 되고 싶어요.”
부부는 케밥 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티마루에 있는 글레니티침례교회(Gleniti Baptist Church)는 정부의 시범 제도 하에 난민을 지원하는 4개의 지역 사회단체 중 하나이다.
담당목사 마크 파벨카(Mark Pavelka)는 15명의 교회 성도들이 이 난민 가정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가구가 완비된 주택을 비롯해 지역 사회 적응, 병원 및 학교 등록, 영어 수업, 취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파벨카 목사는 이번 난민 지원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캔터베리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난민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
https://www.stuff.co.nz/timaru-herald/news/106095164/syrian-refugees-now-call-south-canterbury-home